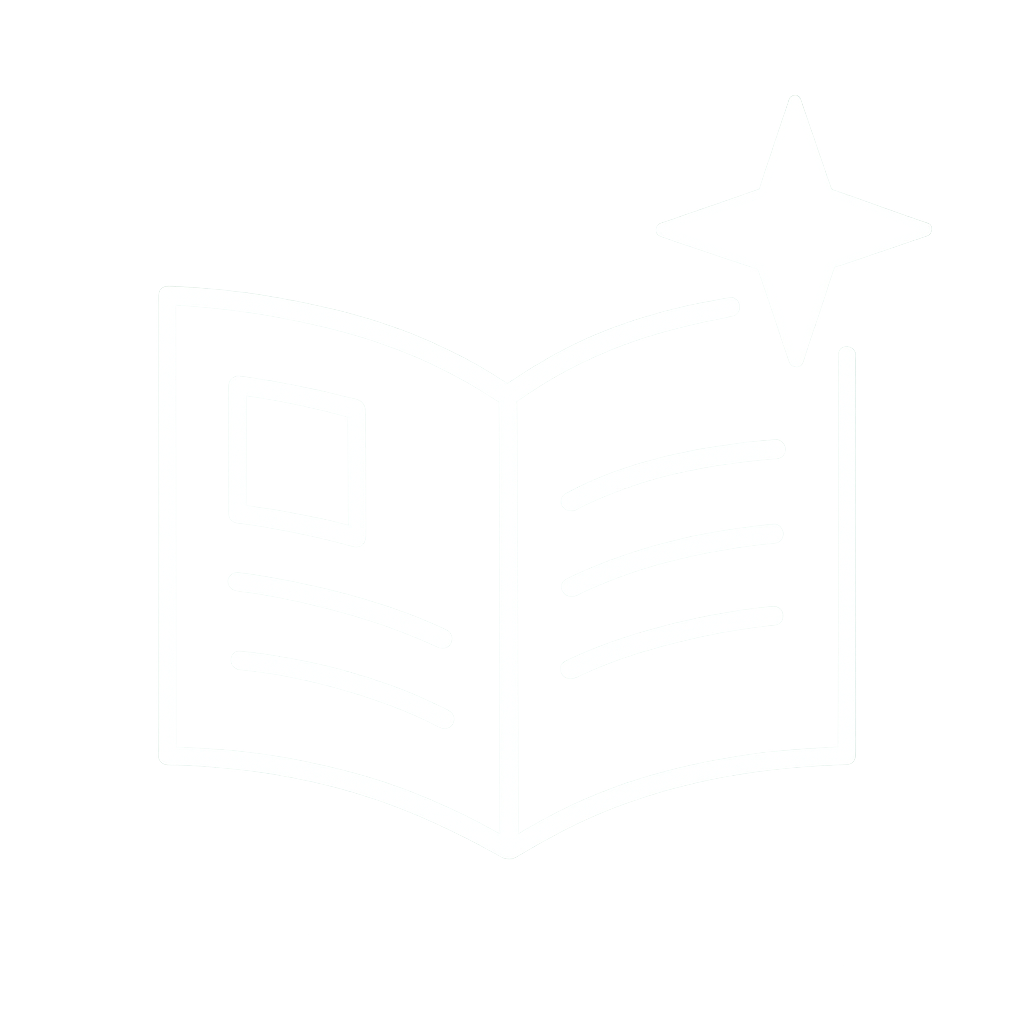축제란 키치가 아니라 오히려 평면화가 빈번한 역동 아닌가. 아닌가? 그게 바로 키치인가. 어쨌거나 원형이 존재한다. 지향점이든 시발점이든 이데아는 실존한다.
그게 표백당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어쩌다보니 최근 자주 받았다는 거지.
여전히 공기 못 읽고 혼자 잘난 줄 알고 '진짜'를 찾아 헤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탓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아무튼... 축제는 좋은 것. 평평하게 단순화된 구호는 호응을 일으키고 역동의 고양감은 개인을 도취시켜 군중이 성립되게 한다. 힘이 없다면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으면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게 표백당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어쩌다보니 최근 자주 받았다는 거지.
여전히 공기 못 읽고 혼자 잘난 줄 알고 '진짜'를 찾아 헤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탓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아무튼... 축제는 좋은 것. 평평하게 단순화된 구호는 호응을 일으키고 역동의 고양감은 개인을 도취시켜 군중이 성립되게 한다. 힘이 없다면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으면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이다.
October 23, 2025 at 4:48 AM
축제란 키치가 아니라 오히려 평면화가 빈번한 역동 아닌가. 아닌가? 그게 바로 키치인가. 어쨌거나 원형이 존재한다. 지향점이든 시발점이든 이데아는 실존한다.
그게 표백당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어쩌다보니 최근 자주 받았다는 거지.
여전히 공기 못 읽고 혼자 잘난 줄 알고 '진짜'를 찾아 헤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탓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아무튼... 축제는 좋은 것. 평평하게 단순화된 구호는 호응을 일으키고 역동의 고양감은 개인을 도취시켜 군중이 성립되게 한다. 힘이 없다면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으면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게 표백당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어쩌다보니 최근 자주 받았다는 거지.
여전히 공기 못 읽고 혼자 잘난 줄 알고 '진짜'를 찾아 헤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탓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아무튼... 축제는 좋은 것. 평평하게 단순화된 구호는 호응을 일으키고 역동의 고양감은 개인을 도취시켜 군중이 성립되게 한다. 힘이 없다면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으면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이다.
여하간 말인즉 가식적인 스마일과 작위적인 나이스함과 더 나아가 으쌰으쌰와 심지어는 충성충성마저도 매끄럽게 굴러가야만 하는 집단생활에 있어서는 그 얼마나 필요불가결한 완충재이자 윤활제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래도 ■■■■ 개새끼들아! 니들은 선 넘었지! 나잇살 처먹을 만큼씩은 처먹은 새끼들이 애들 데리고 똥별놀이하면서 되도 않는 가오 처 부리는 게 정상이니! 야 진짜 같잖아서 진짜 와 나 개새끼들아 니들은 그나마 니들이 제일 낫다매? 근데 사회 나와보니까 니들같이 웃기는 새끼들이 또 없더라! 함께해서 더러웠고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August 12, 2025 at 7:30 AM
여하간 말인즉 가식적인 스마일과 작위적인 나이스함과 더 나아가 으쌰으쌰와 심지어는 충성충성마저도 매끄럽게 굴러가야만 하는 집단생활에 있어서는 그 얼마나 필요불가결한 완충재이자 윤활제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래도 ■■■■ 개새끼들아! 니들은 선 넘었지! 나잇살 처먹을 만큼씩은 처먹은 새끼들이 애들 데리고 똥별놀이하면서 되도 않는 가오 처 부리는 게 정상이니! 야 진짜 같잖아서 진짜 와 나 개새끼들아 니들은 그나마 니들이 제일 낫다매? 근데 사회 나와보니까 니들같이 웃기는 새끼들이 또 없더라! 함께해서 더러웠고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예시가 뒤죽박죽인데 어쨌건 조직에서 요구하는 공적 페르소나란 일할 때 목장갑이나 앞치마가 필요한 만큼이나 실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걸 수행하는 건 전혀 민망할 일이 아니다. 닭살스러울 뿐인 작위적 오버액션이 아니라 매뉴얼에 박힌 권장사항인 것임.
이걸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적은 이유는 그냥 내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겨우 터득해서 그렇다. 남들은 보통 이십대 중반이면 바로 깨치는 것 같던데 나는 그게 안 됐다.
하기사 폐급이 왜 폐급이고 찐따가 왜 찐따겠나. 그게 안 되니까 폐급이고 찐따인 거지.
이걸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적은 이유는 그냥 내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겨우 터득해서 그렇다. 남들은 보통 이십대 중반이면 바로 깨치는 것 같던데 나는 그게 안 됐다.
하기사 폐급이 왜 폐급이고 찐따가 왜 찐따겠나. 그게 안 되니까 폐급이고 찐따인 거지.
August 12, 2025 at 7:30 AM
예시가 뒤죽박죽인데 어쨌건 조직에서 요구하는 공적 페르소나란 일할 때 목장갑이나 앞치마가 필요한 만큼이나 실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걸 수행하는 건 전혀 민망할 일이 아니다. 닭살스러울 뿐인 작위적 오버액션이 아니라 매뉴얼에 박힌 권장사항인 것임.
이걸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적은 이유는 그냥 내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겨우 터득해서 그렇다. 남들은 보통 이십대 중반이면 바로 깨치는 것 같던데 나는 그게 안 됐다.
하기사 폐급이 왜 폐급이고 찐따가 왜 찐따겠나. 그게 안 되니까 폐급이고 찐따인 거지.
이걸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적은 이유는 그냥 내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겨우 터득해서 그렇다. 남들은 보통 이십대 중반이면 바로 깨치는 것 같던데 나는 그게 안 됐다.
하기사 폐급이 왜 폐급이고 찐따가 왜 찐따겠나. 그게 안 되니까 폐급이고 찐따인 거지.
회사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결사된 집단이란 목적 추구에 도움 안 되는 곁가지를 쳐내고 효율적으로 가는 게 미덕이(라 여겨지)며, 성원 개개인의 '진솔한' 에고라는 일반적으로 요철 많은 물건은 아무래도 곁가지인 셈이죠.
'과도한 솔직함'은 종종 불필요한 잡음을 동반하고 이따금은 조직 전체의 생산력까지 저해한다. 타 구성원의 기력을 소모하는 등 코스트를 잡아먹는다는 뜻. 예를 들면 '지나치게 사회성 없이 반응하는' 사람, 더 나아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그리고 '톤 앤 매너를 깨트려 남들 몰입을 방해하는' 새끼 역시도...
'과도한 솔직함'은 종종 불필요한 잡음을 동반하고 이따금은 조직 전체의 생산력까지 저해한다. 타 구성원의 기력을 소모하는 등 코스트를 잡아먹는다는 뜻. 예를 들면 '지나치게 사회성 없이 반응하는' 사람, 더 나아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그리고 '톤 앤 매너를 깨트려 남들 몰입을 방해하는' 새끼 역시도...
August 12, 2025 at 7:30 AM
회사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결사된 집단이란 목적 추구에 도움 안 되는 곁가지를 쳐내고 효율적으로 가는 게 미덕이(라 여겨지)며, 성원 개개인의 '진솔한' 에고라는 일반적으로 요철 많은 물건은 아무래도 곁가지인 셈이죠.
'과도한 솔직함'은 종종 불필요한 잡음을 동반하고 이따금은 조직 전체의 생산력까지 저해한다. 타 구성원의 기력을 소모하는 등 코스트를 잡아먹는다는 뜻. 예를 들면 '지나치게 사회성 없이 반응하는' 사람, 더 나아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그리고 '톤 앤 매너를 깨트려 남들 몰입을 방해하는' 새끼 역시도...
'과도한 솔직함'은 종종 불필요한 잡음을 동반하고 이따금은 조직 전체의 생산력까지 저해한다. 타 구성원의 기력을 소모하는 등 코스트를 잡아먹는다는 뜻. 예를 들면 '지나치게 사회성 없이 반응하는' 사람, 더 나아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그리고 '톤 앤 매너를 깨트려 남들 몰입을 방해하는' 새끼 역시도...
같은 내색으로 '후에엥...'하고 있으니까 이새끼는 진짜 답도 없는 폐급이다 싶었는지 갈수록 구박과 갈굼만 심해졌던 추억.
소위 에이스였던 동갑내기 몇달 선임이 선의의 교화를 '매우 진지하고 사려깊은 태도로' 끝까지 시도했던 점이 이 추억의 백미였다. (미안하다. 너는 사실 인간적으로 제법 괜찮은 선배였는데 이렇게밖에 추억할 수 없다는 점이... 부디 잘 지내길 바란다. 사실 못 지내도 상관 없고.)
근데 뭐 나이 좀 더 먹어보니까 그런 소꿉놀이 같은 연극적 태도라는 게 조직 굴러가는 데 필수적인 재료구나 하는 이해는 생겼고.
소위 에이스였던 동갑내기 몇달 선임이 선의의 교화를 '매우 진지하고 사려깊은 태도로' 끝까지 시도했던 점이 이 추억의 백미였다. (미안하다. 너는 사실 인간적으로 제법 괜찮은 선배였는데 이렇게밖에 추억할 수 없다는 점이... 부디 잘 지내길 바란다. 사실 못 지내도 상관 없고.)
근데 뭐 나이 좀 더 먹어보니까 그런 소꿉놀이 같은 연극적 태도라는 게 조직 굴러가는 데 필수적인 재료구나 하는 이해는 생겼고.
August 12, 2025 at 7:30 AM
같은 내색으로 '후에엥...'하고 있으니까 이새끼는 진짜 답도 없는 폐급이다 싶었는지 갈수록 구박과 갈굼만 심해졌던 추억.
소위 에이스였던 동갑내기 몇달 선임이 선의의 교화를 '매우 진지하고 사려깊은 태도로' 끝까지 시도했던 점이 이 추억의 백미였다. (미안하다. 너는 사실 인간적으로 제법 괜찮은 선배였는데 이렇게밖에 추억할 수 없다는 점이... 부디 잘 지내길 바란다. 사실 못 지내도 상관 없고.)
근데 뭐 나이 좀 더 먹어보니까 그런 소꿉놀이 같은 연극적 태도라는 게 조직 굴러가는 데 필수적인 재료구나 하는 이해는 생겼고.
소위 에이스였던 동갑내기 몇달 선임이 선의의 교화를 '매우 진지하고 사려깊은 태도로' 끝까지 시도했던 점이 이 추억의 백미였다. (미안하다. 너는 사실 인간적으로 제법 괜찮은 선배였는데 이렇게밖에 추억할 수 없다는 점이... 부디 잘 지내길 바란다. 사실 못 지내도 상관 없고.)
근데 뭐 나이 좀 더 먹어보니까 그런 소꿉놀이 같은 연극적 태도라는 게 조직 굴러가는 데 필수적인 재료구나 하는 이해는 생겼고.
비스킷 걍 딸기쨈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샌드위치 비슷하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음.
비스킷 + 딸기쨈 얇게 + 적당한 잎채소 아무거나 + 생햄 얇게 썬 것 + 안 달고 비싼 맛 나는 겨자소스 있으면 햄에다 약간 얹기 + 에그마요
해서 츄라이해봤더니 전에 어디 비싸고 번거로운 데 가서 먹어봤던 그 맛 비슷하게 나더라.
사과 얇게 썰어서 추가해도 잘 어울릴 듯.
참고로
에그마요 레시피 : 삶은달걀에 후추(많이) 맛소금(조금) 파슬리가루 마요네즈 적당량씩 넣고 숟가락으로 으깨기. 이며 에그마요는 식빵 등에 끼워 먹으면 에그샌드위치임.
비스킷 + 딸기쨈 얇게 + 적당한 잎채소 아무거나 + 생햄 얇게 썬 것 + 안 달고 비싼 맛 나는 겨자소스 있으면 햄에다 약간 얹기 + 에그마요
해서 츄라이해봤더니 전에 어디 비싸고 번거로운 데 가서 먹어봤던 그 맛 비슷하게 나더라.
사과 얇게 썰어서 추가해도 잘 어울릴 듯.
참고로
에그마요 레시피 : 삶은달걀에 후추(많이) 맛소금(조금) 파슬리가루 마요네즈 적당량씩 넣고 숟가락으로 으깨기. 이며 에그마요는 식빵 등에 끼워 먹으면 에그샌드위치임.
June 8, 2025 at 9:09 AM
비스킷 걍 딸기쨈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샌드위치 비슷하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음.
비스킷 + 딸기쨈 얇게 + 적당한 잎채소 아무거나 + 생햄 얇게 썬 것 + 안 달고 비싼 맛 나는 겨자소스 있으면 햄에다 약간 얹기 + 에그마요
해서 츄라이해봤더니 전에 어디 비싸고 번거로운 데 가서 먹어봤던 그 맛 비슷하게 나더라.
사과 얇게 썰어서 추가해도 잘 어울릴 듯.
참고로
에그마요 레시피 : 삶은달걀에 후추(많이) 맛소금(조금) 파슬리가루 마요네즈 적당량씩 넣고 숟가락으로 으깨기. 이며 에그마요는 식빵 등에 끼워 먹으면 에그샌드위치임.
비스킷 + 딸기쨈 얇게 + 적당한 잎채소 아무거나 + 생햄 얇게 썬 것 + 안 달고 비싼 맛 나는 겨자소스 있으면 햄에다 약간 얹기 + 에그마요
해서 츄라이해봤더니 전에 어디 비싸고 번거로운 데 가서 먹어봤던 그 맛 비슷하게 나더라.
사과 얇게 썰어서 추가해도 잘 어울릴 듯.
참고로
에그마요 레시피 : 삶은달걀에 후추(많이) 맛소금(조금) 파슬리가루 마요네즈 적당량씩 넣고 숟가락으로 으깨기. 이며 에그마요는 식빵 등에 끼워 먹으면 에그샌드위치임.
하지만 픽션 속의 살풀이로 뭘 할 수 있지. 이제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오직 냉소 뿐인데 냉소는 그들 자신의 졸렬함과 빈약함을 감추고 타인의 투쟁을 모욕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에 쓰인다. 적이란 없고 승복하는 것만이 스마트한 태도이며 그 밖의 투쟁이란 헛되고 구질구질하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무엇인지조차 모를 무엇에게 이름과 형태를 적의 자리를 쥐어줘서라도 무작정 주먹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무엇인지조차 모를 무엇에게 이름과 형태를 적의 자리를 쥐어줘서라도 무작정 주먹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June 4, 2025 at 9:15 AM
하지만 픽션 속의 살풀이로 뭘 할 수 있지. 이제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오직 냉소 뿐인데 냉소는 그들 자신의 졸렬함과 빈약함을 감추고 타인의 투쟁을 모욕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에 쓰인다. 적이란 없고 승복하는 것만이 스마트한 태도이며 그 밖의 투쟁이란 헛되고 구질구질하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무엇인지조차 모를 무엇에게 이름과 형태를 적의 자리를 쥐어줘서라도 무작정 주먹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무엇인지조차 모를 무엇에게 이름과 형태를 적의 자리를 쥐어줘서라도 무작정 주먹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벌써 5년 전의 메모로는 이런 게 있다: 요즈음의 펄프픽션들에는 꼭 형편 좋은 초월적 거악이 등장하곤 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무슨 감상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다. 눈앞에 적당히 던져지는 자잘하고 지긋지긋한 소악당들을 두들겨가며 탑을 오르다보면 어느순간 선형으로 연결되던 서사가 끊기고 탑이라는 시스템 밖에서 꼭대기보다도 더 너머에서 이쪽을 내려다보던 흑막이 비로소 등장한다. 대중문학에는 가장 바라는 것이 투영되는 법이라는데 결국 우리는 실체 없는 적에 공기 중의 독에 이름을 부과해서라도 원하는 건가. 칼을 찌를 수 있는 몸을.
June 4, 2025 at 8:44 AM
벌써 5년 전의 메모로는 이런 게 있다: 요즈음의 펄프픽션들에는 꼭 형편 좋은 초월적 거악이 등장하곤 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무슨 감상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다. 눈앞에 적당히 던져지는 자잘하고 지긋지긋한 소악당들을 두들겨가며 탑을 오르다보면 어느순간 선형으로 연결되던 서사가 끊기고 탑이라는 시스템 밖에서 꼭대기보다도 더 너머에서 이쪽을 내려다보던 흑막이 비로소 등장한다. 대중문학에는 가장 바라는 것이 투영되는 법이라는데 결국 우리는 실체 없는 적에 공기 중의 독에 이름을 부과해서라도 원하는 건가. 칼을 찌를 수 있는 몸을.
우리는 싸울 수가 없고 싸우고 싶어도 적이 어디에 있는지 있기나 있는지 '나는 아무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주먹을 내지르는 것이 과연 비웃음을 사지 않을 수 있는 일인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순간 냉소를 업으로 삼게 된 것 같다 무력함을 은닉하고 싶기라도 한 것처럼. 열혈은 픽션 속 캐릭터의 속성으로만 발자국 화석처럼 남고 터빈을 돌릴 뜨거운 피가 더는 없는 거지. 시스템에 화를 내봤자 자연물에 화를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바보 천치 짓인 거지. 모두 뒤틀린 것 같은데도 모두 순리대로 흐르고 있다.
June 3, 2025 at 12:54 PM
우리는 싸울 수가 없고 싸우고 싶어도 적이 어디에 있는지 있기나 있는지 '나는 아무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주먹을 내지르는 것이 과연 비웃음을 사지 않을 수 있는 일인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순간 냉소를 업으로 삼게 된 것 같다 무력함을 은닉하고 싶기라도 한 것처럼. 열혈은 픽션 속 캐릭터의 속성으로만 발자국 화석처럼 남고 터빈을 돌릴 뜨거운 피가 더는 없는 거지. 시스템에 화를 내봤자 자연물에 화를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바보 천치 짓인 거지. 모두 뒤틀린 것 같은데도 모두 순리대로 흐르고 있다.